기독교 문신, 2천 년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페이지 정보
기사 작성일2025-04-17관련링크
본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주간과 부활절은 많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이다. 이 시기를 교회 예배, 금식과 기도, 촛불과 향, 성찬과 참회로 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또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전통이 있다. 바로 문신이다. 특히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 가운데는 손목이나 팔에 십자가나 어린양의 문양을 새기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연합하려는 이들이 있다고 theconversation이 소개했다.

▲문신은 단지 최근의 유행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존재해 온 깊은 기독교적 실천이었다.(AI 생성사진)
문신은 단지 최근의 유행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존재해 온 깊은 기독교적 실천이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직후,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삼아 ‘AM(ad metalla)’라는 문신을 새겼는데, 이는 광산으로 유배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박해받지 않은 신자들 또한 물고기, 십자가, 어린양 같은 상징을 자발적으로 몸에 새기며, 예수님과의 연대를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기록에 따르면 3세기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손목에 문신을 새겼고, 6세기 흑해 인근의 유목민 스키타이족에게 파견된 선교사들도 전염병을 막기 위한 보호의 표식으로 이마에 십자가 문신을 권했다. 중세 십자군과 순례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문신을 받았고, 돌아온 뒤 그 문신을 자랑스럽게 간직했다. 유럽에서도 신자들은 주님의 이름, 성모 마리아, 성경 말씀을 새기며 신앙의 표식으로 삼았다.
문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타투(tattoo)’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말이다. 이는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제독 루이 드 부겐빌과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남태평양을 탐험하던 중 원주민들이 부르던 ‘타타우(tatau)’라는 말을 보고서 서구 언어에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말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기독교 세계에서는 ‘문신’이란 행위가 존재했고, ‘표시하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스티조(stizo)’나 ‘징표’란 뜻의 라틴어 ‘시그눔(signum)’, 그리고 ‘낙인’ 또는 ‘상처’를 의미하는 ‘스티그마(stigma)’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유럽으로 퍼진 신앙 문신
브리튼섬을 복음화하기 위해 파견된 교황청 사절단은 이방의 '피트족'이 문신으로 뒤덮인 것을 보고는 우려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문신은 보상받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787년 노섬브리아 공의회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고, 요크의 성 윌프리드 주교도 십자가 문신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당시는 문신이 기독교적 열심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
1300년대 이탈리아에는 위험한 성지순례 대신 안전한 대체 순례지로 ‘성산(Sacri Monti)’이 생겼고, 특히 로레토 성지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목수, 구두장이, 장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새겨주는 일이 있었다. 나무 판에 문양을 새기고 몸에 도장을 찍듯 전사하는 방식이었다. 위생 문제로 1871년에 금지되었지만, 신자들은 몰래 그 전통을 이어갔다.
현재에도 살아있는 고대의 전통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의 콥트교회에서는 세례와 함께 문신을 새기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는 27대째 문신을 이어온 와심 라주크(Wassim Razzouk) 가문이 여전히 순례자들의 손목에 십자가를 새겨주고 있다. 그는 조상이 사용하던 500년 된 나무 틀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베들레헴의 나티비티 교회를 찾는 순례객들도 그곳에서 종교 문신을 받는 전통을 계속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문신 예술가 조나탈 카르두치(Jonatal Carducci)가 로레토의 전통을 복원하고 있다. 그는 과거 목수 레오나르도 콘디티가 일하던 작업장을 복원해 60가지 넘는 종교 문신 디자인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 문신의 역사와 의미를 오늘의 신자들과 나누고 있다. 십자가, 로레토의 성모, 예수의 성심 등을 새기는 이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감동이 담겨 있다.
새겨진 신앙의 흔적
르네상스 이후 서구 지식인 사회는 문신을 식민지 원주민이나 범죄자, 하층민의 표식으로 여겼고, 가톨릭 자체도 미신으로 취급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문신은 사라진 적이 없다. 오히려 교회의 제도 밖에서 오랜 시간 조용히 이어져 온 신앙의 언어였다. 이는 마치 손에, 이마에 새긴 ‘여호와의 이름’처럼, 세상의 눈엔 작아도 하늘에는 선명한 믿음의 표식이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문신은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성지에서, 성당 옆에서, 혹은 은밀한 방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새긴다. 그것은 단지 예술이 아니라, 신앙을 피부로 고백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부활절마다 누군가는 그 부활의 확신을 팔뚝에 새기며 말없이 속삭인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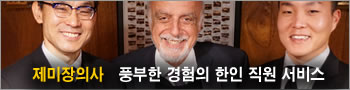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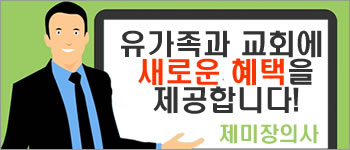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